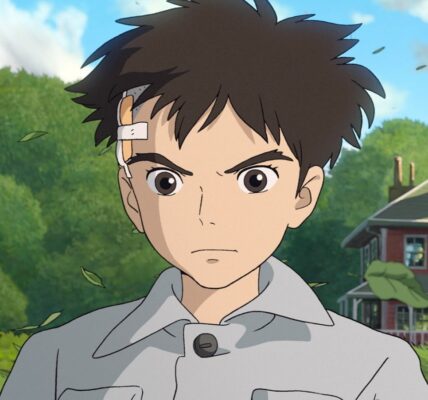환경운동연합이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아 핵무기와 핵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6일 논평을 통해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단 한 번의 폭발로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올해로 참사가 벌어진 지 80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약 7만 명의 조선인이 있었고, 이 중 4만 명 가까이가 1945년 말 이전에 사망했다”며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비극적인 역사를 강조했다.
생존자들은 피폭 후유증과 함께 귀국 후에도 사회적 편견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경남 합천 등지에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 ‘비정상’ 낙인 찍힌 원폭 피해 2·3세… 정부 책임 회피 지적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피폭 2세·3세는 방사능 유전성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방사선 노출과 유전 질환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왔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통은 통계가 아니라 몸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고통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 “핵은 평화롭게 사용될 수 없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동전의 양면
단체는 또한 핵발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핵은 평화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로 들며 “핵발전조차 단 한 번의 사고로 수십 년간 회복되지 않는 재난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 사태를 언급하며 “핵발전의 ‘안전 신화’는 이미 무너졌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핵발전과 핵무기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둘 다 생명과 안전이 아닌 권력과 이윤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며, 그 피해는 언제나 가장 약한 이들에게 집중된다”고 역설했다.
국내외적으로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고, 한반도 역시 전술핵 재배치 논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이 핵전력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새로운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핵 없는 세상은 인류가 지속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핵무기로 희생된 이들, 핵발전소 주변에서 일상을 착취당하는 이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해줄 사람조차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