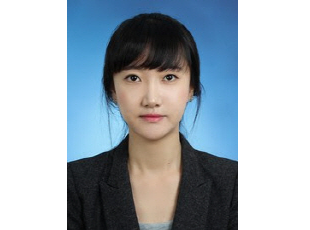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정책으로서 커뮤니티 케어는 이른바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내놓았고, 올해 4월엔 8개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지자체를 선정·발표하였다. 이 중 노인 돌봄 모델 사업은 5개로 광주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가 선정되었다. 또 대구 남구와 제주 제주시는 장애인 선도 사업에, 경기 화성시는 정신질환자 선도 사업에 선정되었다.
각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내용은 상이하지만 이들 선도 사업은 첫째, 지역사회 자율형의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하고, 둘째, 민·관 협력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자산조사(means-tested) 기반의 선별적 복지에서 욕구 기반(needs based)의 보편적 서비스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보건복지부, 2019). 간단히 요약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돌봄을 얻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살던 곳, 나의 공동체는 어디인가?
앞서 언급된 선도 사업의 대상이 노인에 집중된 것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연장된 노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 마을, 지역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거주지를 떠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커뮤니티 케어’는 노년 시기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커뮤니티 케어의 실행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즉 익숙한 생활환경을 전제로 한다.
몇 십 년 동안 한 동네 또는 같은 지역에 살았던 이들에게 이 ‘커뮤니티’의 의미는 삶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행정상의 구역 또는 편리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 자기 인생의 흔적과 기억들, 이웃들이 있는 곳이 커뮤니티, 다시 말해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삶을 존중받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각종 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오랜 역사를 지닌 독일
이제 막 출발한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가 이런 살아있는 공동체, 움직이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실행된 선진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지면을 통해 국외의 다양한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소개되었고 또 연구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주민 중심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독일의 커뮤니티 케어 사례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사실 독일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이 용어 자체가 영어로 된 것이기도 하지만, 독일의 사회복지 및 자치행정의 원칙 및 제도를 고려한다면 굳이 이런 용어 사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은 16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인데, 각 주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Stadt, Kreis etc.)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행정(Kommunale Selbstverwaltung)이 시행된다. 이는 각 지역사회가 내부의 모든 문제를 조정할 책임과 자치행정권 및 재정자율권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의 모든 문제’에는 지역 주민의 복지에 관한 부분도 포함된다. 이 지방자치행정 제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실행된다. 이것을 ‘지역사회서비스(Kommunaler Sozialdienst: KSD)’라고 한다. 제도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별다른 점은 없는 셈이다.
지역사회서비스(KSD)에는 정보, 상담, 파트너 간 갈등·별거·이혼 상태에서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 중재, 임신 지원 및 파트너십 지원, 채무자 상담, 개인 위험 개입, 질병 예방 및 보조, 돌봄 및 요양 지원, 노인 돌봄, 사회부조 지원 및 연결, 장애인·외국인·무주택자들과 같은 특수한 사회적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통합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모든 대상에게 다양하고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주체들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독일의 특별한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는데, 비영리자율복지단체(Freie Wohlfahrtsverbände)가 그것이다. 물론 주(Land), 시(Stadt)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독일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큰 기둥을 이루는 비영리자율복지단체가 각 지역사회마다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잘 알려진 카리타스(Caritas), 디아코니(Diakonie)가 있고, 이외에도 독일적십자(DRK), 노동자복지단체(AWO), 평등권익복지단체, 유대인복지협회는 가장 규모가 큰 단체들이다. 이들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민간복지단체로서 디아코니와 카리타스의 경우 19세기에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2~3만여 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단체들 역시 100년 안팎의 오랜 역사를 지닌 조직들이다. 민간 영역에 속하지만 이들은 가톨릭이나 개신교 같이 종교에 기반을 두거나 노동자 또는 특정 대상의 복지를 추구하며 발생한 조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공급자들은 아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민간복지단체들이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위에서 노년 시기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하며, 여러 가지 관련 프로젝트를 시도하였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고독 또는 고립에 처할 위험이 높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자기 역량의 강화,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구한다.
참여와 신뢰를 지향하는 독일의 ‘커뮤니티 케어’ 사례
첫 번째 사례로서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발표한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모델 프로젝트인 “지역사회의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2012년부터 2013년 중반까지 3개 지역에서 실행되었다. 실행 지역은 20세기 중후반 독일 공업지역의 핵심을 이루었던 곳으로 지금은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하여 주민의 대부분이 노인들로 구성된 지역이다. 두이스부르크-부륵하우젠/오스트아커 지역은 1인 노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동체 역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개신교 교회의 담당 교구와 해당 지역의 독일 적십자(DRK) 법인이 연계하여 노인들의 고립을 예방하고,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 이웃 간 협력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알트-에어크라트에서는 지역의 카리타스와 디아코니 기관들이 소모임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접촉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필요한 경우 팀을 형성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작은 일에도 직접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에게는 장보기, 차량 지원, 세탁 서비스 등으로 지원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노인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집과 마을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묀헨글라드바흐-빅크라트에서는 노인들이 지역의 오래된 이웃들과 함께 친교와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지역의 노동자복지단체(AWO)와 개신교 교회가 소통의 공간을 제공했다. 이런 수행 내용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이웃들의 작은 배려가 이루어지며, 지역사회 이웃 간 관계에서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2011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실행되었던 “이웃 지원과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노년을 내 집에서-사회적 거주”라는 정책 하에 전국 약 500개의 신청 중에서 총 46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전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도움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해당자들의 불필요한 시설 입소를 피하거나 지연시키고, 자택에서 치료 및 돌봄을 최적의 환경 속에서 제공받게 하는 것이다.
46개의 프로젝트 중 바덴-뷔템베르크 주의 슈배비쉬 그뮌트 시(市)에서는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돌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시니어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 역시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과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 공급자들, 구청, 돌봄요양센터, 치매돌봄센터, 기타 상담센터, 시(市)노인위원회, 교회, 이웃, 주택협회, 가족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서비스는 주거상담, 장보기 서비스, 점심식사 서비스(“그뮌트 배달”), 노인이동 서비스, 노인동행 서비스, 방문 서비스, 수리 서비스, 노인 친화적 서비스(“병원에서 일상으로의 다리 연결”), 호스피스 및 돌봄 전화(“아침 인사”) 등이 제공되었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로서 이동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들은 이동 서비스 없이는 움직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 서비스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운전기사들도 항상 노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표현하였는데, 이런 반응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하나의 새로운 초석이 세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민이 주인 되는 공동체라야!
앞서 소개한 독일의 두 개 사례에서 모두 표면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활성화 된 시스템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이런 시스템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노인 돌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며 커뮤니티 케어가 실행 중이다. 그러나 독일의 커뮤니티 케어가 추구했던 것과 그 실행 결과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 부각이며, 돌봄을 받는 노인들이 바로 커뮤니티 케어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상호 간의 관계에 신뢰가 쌓여 ‘움직이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간 것이다.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는 관(정부)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 하에 실행될지라도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커뮤니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토론을 통해 돌봄의 주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공동의 영역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이웃의 욕구와 문제를 나의 것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의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와 시설 이전에 먼저 ‘살아있는 공동체’ 형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