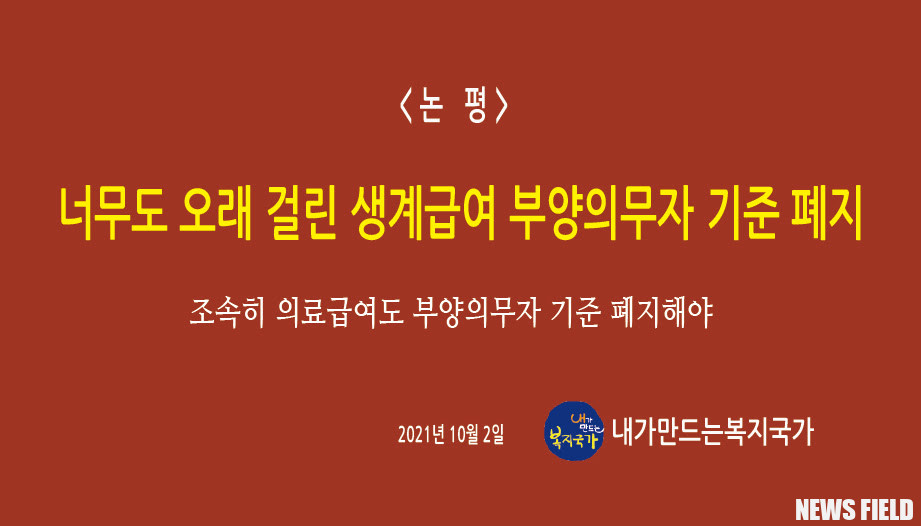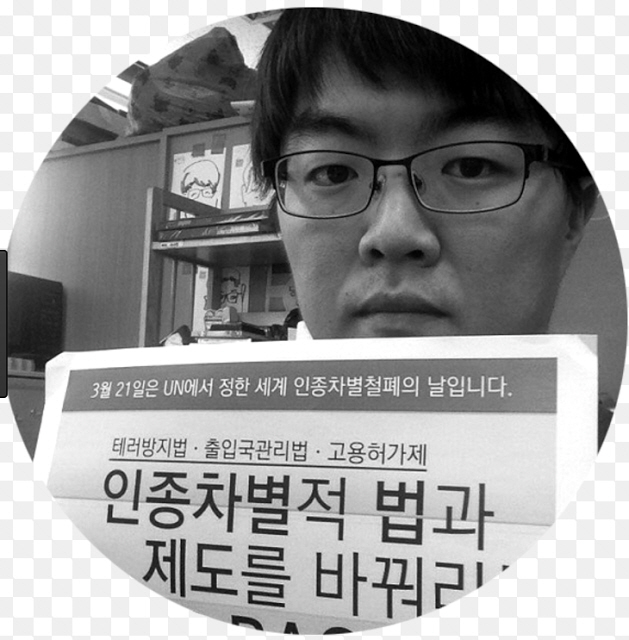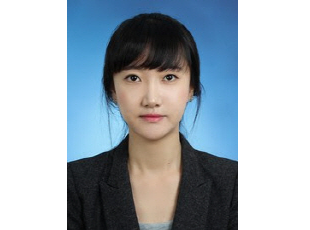10월 1일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2017년 11월부터 추진되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의 마무리다. 가난한 사람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복지 책임을 가족부양에 굴레 씌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 수순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아직 부양의무자 폐지를 환영하기에는 이르다. 여전히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로드맵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작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3)에서는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겨울, 사망한 지 약 5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된 방배동 김 씨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표적 피해 사례다. 방배동 김 씨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였다. 병원에 갈 수 없었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신청을 포기했었다.
가난과 질병은 함께 온다. 사실상 동일한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인데도 왜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존속해야 하는가?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홍보할 수 있는가? 2017년 UN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 사회권규약 이행사항에 대한 권고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절대빈곤층 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임을 지적한 것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폐지에도 한계는 있다.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혹은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물으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60년이다.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가난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고사시켜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늘에 이르는데 60년 걸렸다. 가난하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토록 더디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홍보하기 전에 먼저 부끄러워야 한다. 조속히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