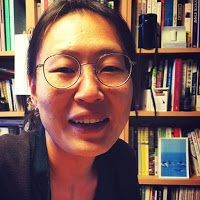
<재난을 묻다>는 한국사회에서 수많은 참사가 되풀이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책이다. 앞선 참사의 이야기를 곡진한 정성으로 기록해낸 작가들은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회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두려움이 느껴졌다.” 아직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고 있다.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을 안도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그런데 ‘운’이라는 것조차 우연이 아니다.
작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살인의 이유를 묻는 경찰에게 살인범은 평소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해왔다고 주장했다. ‘살아男았다. 살女주세요’라는 누군가의 포스트잇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여자라서 죽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강력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점을 은폐한다. 정부는 이 사건이 여성혐오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기 급급했다. 살인범이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몰아가기 시작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로 여성혐오의 현실을 은폐하려 들었던 것이다.
‘혐오 돌려막기’는 익숙한 풍경이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구조적으로 제약되는 조건을 숨기며, 피해자나 가해자의 비정상성으로 사건을 설명한다. 이런 접근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정부는 마치 특정 집단을 배제하면 안전이 달성된다는 환상을 주입시킨다. 일상의 구조적 문제를 ‘낯선’ 가해자의 문제로 축소해버린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외국인이거나 하는 이유를 들이대며 또 다른 소수자의 권리를 억압한다. 정작 바꿔야 할 것은 늘 그대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혐오를 빌어 피해자를 문제 삼기도 한다. 강남역 사건 당시에도 ‘왜 그 시간에 강남역에서 놀고 있었나’를 묻는 인터넷 댓글들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가난한 아이들이 경주 불국사나 가지 왜 제주도를 갔냐’고 묻던 막말과 다를 바가 없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사라지고, 제 목숨 지키지 못했다고 피해자가 비난당하는 것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혐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손쉽게 혐오에 노출되어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자체다.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혐오범죄의 피해자가 된다. 작년 미국에서 발생한 올랜도 총기난사 사건은 수십 명의 성소수자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일본에서는 쓰구이야마유리엔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수십 명의 장애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전세계를 경악하게 한 이 사건들은 일상에서 조금 다른 양상으로, 조금 작은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위해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다.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은 혐오범죄에 대응하는 양상이 재난이나 참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초기 정부가 유병언몰이에 나섰듯 원인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며, ‘교통사고’일 뿐이라는 권력의 해석에 동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고립되고 배제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연대의 움직임도 탄압당한다. 그리고 어떤 위험은 저평가된다. 가난할수록, 소수자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감내해야 하는 위험이 더 커진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덜 문제시된다. 불평등한 사회는 위험하다.
안전에 대한 권리는 비차별의 원칙과 평등의 가치를 고려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작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우리는 안전이 평등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대피 명령이 있더라도 장애인은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공포에 직면해야 했고, 붕괴된 철로 수선 작업에는 하청노동자가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었다.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건을 마주할 때, 눈에 띄는 ‘낯선’ 원인을 지목하는 것은 편리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운’에 기대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혐오를 지워야 한다. 오는 17일 저녁 강남역에서는 한 여성의 죽음이 일깨운 현실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린다. 안전에 대한 권리는 이렇게 우리의 권리가 되어갈 것이다.뉴스필드














